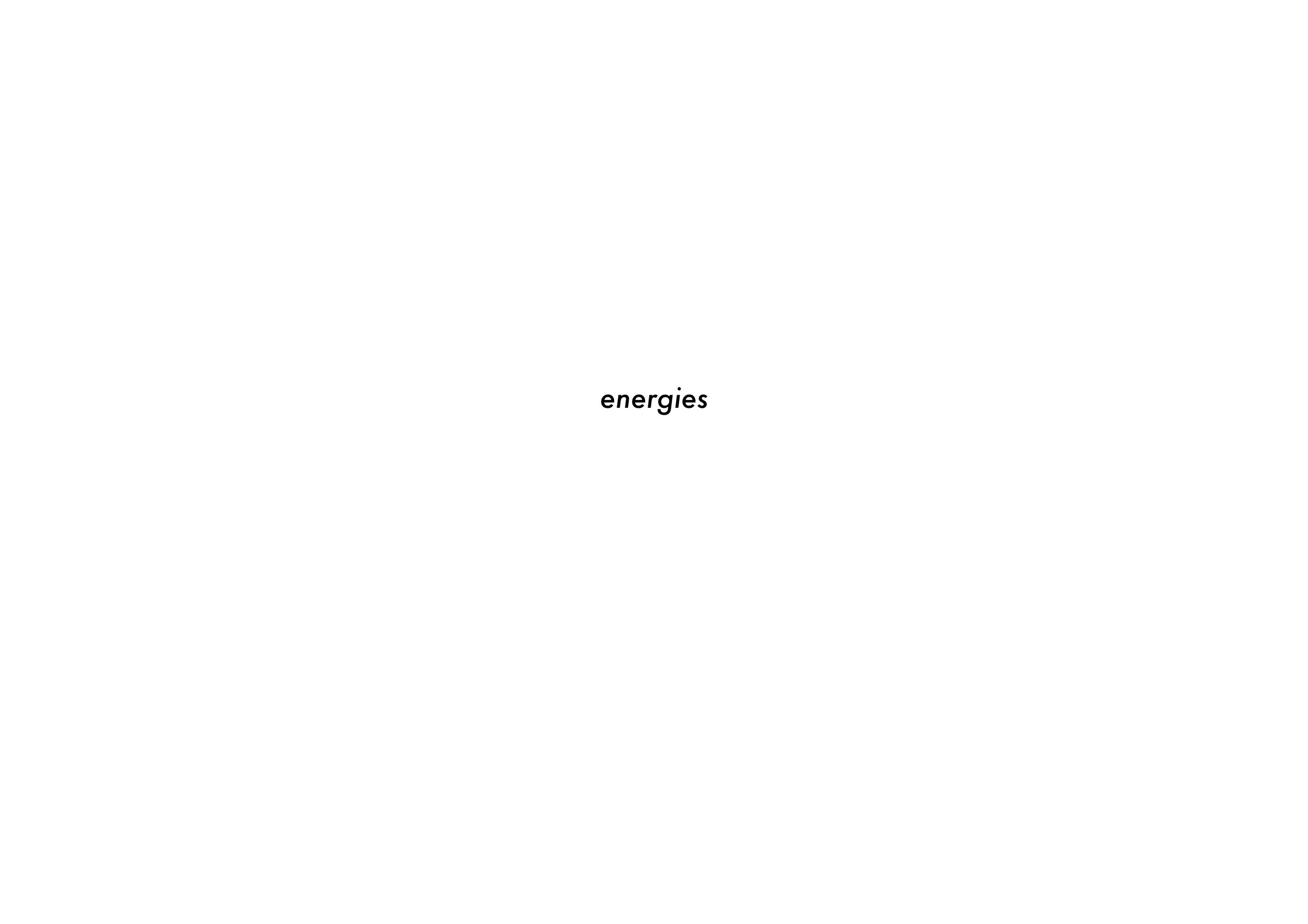유독 눈에 띄고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느린 사진을 자주 선택한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혹은 천천히 시간이 가는 것 같은. 어떤 물질의 표면(물성)이 손끝에 닿았을 때 과거 특정 시간에 대한 기억이 소환되는 일을 종종 경험한다. 그 경험은 여행지에서 얻은 사소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고국으로 들고오는 애틋하고 유치한 습관으로도 전이된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싱크대 안 비닐집합소에 깊숙이 손을 밀어 넣었을때 우연히 일본의 비닐 봉지가 만져지면 불현듯 기억이 열리며 ‘그 때’가 보이는 것이다. 일본 수퍼마켓에서 받은 비닐 봉지를 일본에 버리지 못하고 한국까지 갖고 들어오는 습관 탓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들은 예외없이 우리집 싱크 대 안에 구겨지는 신세가 되버리지만 그 비닐의 촉감은 나를 ‘그 때’로 소환한다.
2012년 아내에게 청혼하고 결혼 반지만큼은 좋은 것을 맞추기 위해 압구정 현대 백화점을 찾은 날, 지하 1층에서 밥그릇 4개를 함께 샀다. 살면서 다 깨지고 마지막 남은 밥그릇을 보고 있자니 애잔한 마음이 들어 사진으로라도 남겨야겠다 싶었다. 마지막 밥그릇을 찍은 사진을 보면 결혼을 준비하며 걷던 길도 떠오르고 피부는 그 겨울 추위를 함께 느낀다. 밥그릇을 고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고대하던 모습도 떠오른다. 남들도 다 나처럼 밥그릇을 꼼꼼하게 골랐을까. 삶이 녹록치 않을 때는 음식값을 먼저 줄인다. 빈 주머니는 가장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기도 한다. 살아야하니 먹어야 하고, 먹으려는데 넉넉하지 못할 땐 쌓여있는 빈그릇에 울컥하기도 한다. 나의 삶은 금그릇 은그릇이라기 보다는 질그릇에 가깝다. 깨끗한 질그릇이기를 바라며 살았다. 그러나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생채기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훈장이라기보단 오히려 감추고 싶은 흉에 가깝다. 밥그릇에 이가 나간 것 쯤이야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 ‘사람들은 다 자기 밥그릇은 달고 태어난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은 사실일까.
모든 것을 소멸하는 가장 뜨거운 불, 시간을 버텨낸 도자기는 보물이 되면서 깊은 내면 세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 밥그릇들은 태어나자마자 살아남아야 하는 가혹한 운명에 놓인 불완전한 존재들의 사멸해가는 심전도 기록으로 보인다.
글, 사진 박신우
For some reason a pedestrian walking by slowly would catch my attention more than people running past quickly- on a similar note, I tend to take slow photographs. Photographs where time seems to have paused.
Some objects, when touched by the tip of your hand, evoke a memory from the past and take you back to a certain time. That experience is reflected in the tedious habit of bringing back the most mundane objects from traveling. For example, when I reached down the pile of old plastic bags to pour in leftovers, and felt at the tip of my hand a certain special touch of plastic bags from Japan, the door to my memory opened and I suddenly saw ‘that time’. Thanks to my tedious habit of hoarding Japanese plastic bags that end up wrinkled up in my storage below the sink, the texture of the plastic bag transfers me back to ‘that time’.
In 2012, I set out to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in Apgujeong with the intention of finding a nice ring to propose with, and ended up also buying 4 plates that day. Now 3 of them have been broken, but the last one stands- feeling slightly nostalgic, I decided to document it in a photograph. The photograph of the last plate reminds me of that walk to the department store preparing for my wedding and how cold it was then. I also remember how fluttered I was choosing those plates, eager for a married life. Did other people take so much time in choosing plates too?
When life is tough, the first thing you cut back is on food, which is also one of the most effective forms of losing weight. When the plate is empty, it can trigger depression-it’s as though you are ridding yourself of the bare necessity, the bare minimum for survival. My life is closer to a plate of pottery than silverware-I have lived life wishing it would be a clean plate, but the process of keeping it clean left scars I want to hide rather than a glorious wound. A chip in my plate now holds no effect on me anymore. Is the saying, ‘People are all born with their own plates (fate)’ really true?
Hot fire dissolves everything, but a plate of pottery withstands the unbearable temperature transforms itself into a precious treasure with its own deep internal world. However, the plates are burdened with the harsh reality of their fragile destiny the moment they come to life-at any moment, they may break.